
- 뉴스
- 이민
- 교육
- 음악/동영상
- English
취임 초부터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미술대학 김민수 전 교수의 복직문제였다. 김 교수는 1998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는데, 내가 취임한 뒤 대학본부 바로 앞에 천막을 쳐 놓고 외롭게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교무처장에게 그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벌써 5년이나 경과하여 김 교수의 생활이 순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다, 세월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당사자와, 당사자의 재임용을 거부한 미술대학 측은 견해와 입장이 판이하게 엇갈렸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은 원심파기 소송으로 김 교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나는 그것으로 일을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전원이, 김 교수가 재임용 소송에서 일단 승소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려는 것에 반발해 집단사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분들은 김 교수 논문의 표절 의혹과, 복직투쟁 과정에서의 미술대학 교수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복직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나는 인사위원들에게 "이 사안은 개인의 고통이 걸려 있는 만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회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내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나를 고뇌와 번민에 빠뜨린 사건은 또 있었다. 황우석 교수의 일이다. 2005년 가을까지만 해도 총장의 시각으로 볼 때, 황 박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이기 이전에 서울대의 자랑이었다. 그분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비친 한줄기 희망의 빛이자, 같은 길을 걸으려는 후배들의 우상이기도 했다. '이공계의 위기'라는 말이 일상화됐을 정도로 인재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생명공학 분야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줄지어 몰렸던 것도 황박사의 공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적 신드롬이었다.
나는 발전 가능성이 큰 젊은이들이 과학에 뜻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포스코의 제의를 받아들여 황박사를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서울대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우연의 일치였지만 황 박사에게 정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되고 밀착경호가 붙은 것도 이때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황 박사의 연구 결과를 의심하는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해외 권위지에 게재된 논문이 진실성 여부가 사건의 초점으로 대두됐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경우야말로 실력 있는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일임하여 양심적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자 정도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명희 전 부총장에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뢰했다. 그리고 노정혜 연구처장에게는 간사 역할을 부탁했다. 정 부총장은 약리학 전공인 의대 교수이고, 노 처장은 자연대에서 분자 생물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생명공학(BT) 분야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식견과 조예를 갖춘 적임자들이었다. 만나는 분마다 내게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렇게 파악했다. 우선 난치병 환자들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의 희망을 꺽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 그리고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신화가 된 과학자가 결부된 문제이니만큼 최대한 주의하지 않으면 그 사건의 여파로부터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나 또한 국제적으로 한국 과학계의 명예와 서울대의 도덕적 존립기반이 좌우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을 소홀히 다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게다가 꺼져가는 불씨라도 살려 보려고 애태우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나아가 생명공학(BT)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앞에서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담고 있는 황 박사를 어떻게든 보호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일수록 정도(正道)로 가야 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는 법. 나는 평소 지켜온 소신을 가다듬으며, 우리 학계와 서울대학에 일찍이 없었던 사건인 만큼 역사의 법정에 선 판사처럼 엄정한 자세를 취해 달라고 정 부총장에게 당부했다.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기가 어려워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면, 머릿속에는 김구 선생의 유묵으로 접한 서산대사의 시구가 맴돌았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는 모름지기 허튼 걸음을 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가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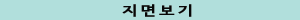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