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이민
- 교육
- 음악/동영상
- English
관심이 지나쳐 ‘텃세’… 귀농인은 괴로워
원주민 “마을잔치비 내라”
백만원대 발전금도 요구…
연고 없는 사람엔 더 받아
서러움 느끼는 귀농인들
전기 없어 공사하는데 “왜 말도 없이 공사” 훼방
#1.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 이장 정모(65)씨는 어버이날 마을잔치를 앞두고 귀농인 A(58)씨와 시비가 붙었다. 정씨가 마을잔치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고 A씨가 “왜 귀농인들에게만 돈을 요구하느냐”며 항의하자 말다툼이 벌어졌다.
화가 난 정씨는 A씨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길질했다. A씨는 척추와 무릎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정씨를 고소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정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을잔치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한 것이지 돈을 내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2. 인천 옹진군 덕적면 한 섬마을 이장을 했던 배모(63)씨는 마을발전위원장을 맡으면서 섬으로 이주해온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걷었다.
섬이 고향인 이주민들에게는 150만원, 연고 없이 들어온 외지 출신에게는 300만원을 받았다. 돈 내는 것을 거부했던 주민들에게는 “섬에 살면서 주민으로 인정받고 해산물 채취를 하려면 발전기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민 6명에게 1750만원을 강압적으로 받아낸 혐의로 배씨를 지난 3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다른 주민에게 모욕죄로 기소돼 선고받은 벌금 70만원을 마을발전기금에서 내고, 공동수도요금 500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경찰에서 “마을발전기금은 규정에 따라 걷은 것이고, 모욕죄 벌금은 마을 일을 하다 생긴 일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얻어 발전기금으로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강요받은 주민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작은 마을이라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6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귀농인은 1만3019명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고 귀농 가구도 1만2875가구로 7.7% 증가했다. 30대 이하 귀농인은 1353명으로 처음으로 전체 귀농인 중 10%를 넘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읍·면 생활을 택한 귀촌인도 전년보다 1.9%(8711명) 증가해 47만5489명에 달했다. 이처럼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거나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느는 가운데, 시골 마을에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주민들은 땅과 집을 사서 불쑥 나타난 외지인이 마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시 깍쟁이 짓을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 청주시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 주민 김모(여·57)씨는 “집 앞쪽 밭을 사서 들어온 외지인이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하더니 30년 넘게 진입로로 썼던 땅도 공사에 포함했다”며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막혀 차량은 고사하고 사람 겨우 하나 다닐 만한 좁은 길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평균 농촌 거주 기간이 약 42년인 시골 주민 94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갈등 이유는 ‘농촌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29.3%)’이 가장 높았고 ‘마을 일이나 행사에 불참(21.0%)’, ‘집·토지 문제 또는 재산권 침해(10.7%)’, ‘도시 생활 방식을 유지(10.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귀농·귀촌을 했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원주민들 텃세 때문에 귀농·귀촌 생활이 어렵다고 말한다. 은퇴를 앞둔 초등학교 교사 김모(58)씨는 지난해 말 경남 하동군 지리산 자락에 작은 집과 텃밭을 샀다. 김씨는 현재 주소를 이곳으로 옮겨 귀촌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귀농할 계획이었다.
김씨가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전봇대 설치 공사를 시작하자 마을 주민이 “왜 이야기도 없이 먼지 나는 공사를 시작하느냐”며 훼방을 놓기 시작했다.
김씨는 “작업 차량이 드나드는 길에 누군가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워놓고 사라지는 바람에 며칠 걸릴 공사가 두 달 넘게 걸렸다”며 “연고가 없는 곳에 들어와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에서 귀농을 준비 중인 김용남(66)씨도 “귀농 장소를 고를 때 마을 분위기나 텃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지인이라고 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곳은 무조건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한 1000가구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촌 적응에 실패해 다시 도시로 되돌아오는 ‘역(逆) 귀농’을 계획 중인 가구가 각각 4%와 11.4%로 나타났다.
소득 부족(37.8%)이 주된 사유였지만 이웃 갈등·고립감(16.9%)도 적응 실패 원인으로 꼽혔다. 김귀영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은 “같은 상황을 원주민은 ‘관심’으로, 귀농·귀촌인은 ‘참견’으로 보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며 “귀농·귀촌은 유학이나 이민 준비처럼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년 대구 시내 식당을 접고 경북 의성군으로 귀농한 한재호(46)씨는 “마을에 적응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과 차량 운전 등 젊은 사람이 해줘야 하는 일을 나서서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니 동네 어르신들도 마음을 열고 놀리는 땅을 부치게 해주거나 작물 재배 노하우를 알려줘서 외지인 출신이지만 새마을지도자도 하며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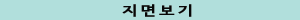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