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이민
- 교육
- 음악/동영상
- English
별명 붙이기
흩어져 사시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다가 보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 자기 스스로나 아니면 남들이 지어준 이름들이 있습니다. "별명"이라고도 하고 "호"라고도 하고 또는 "아명"(시적인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저의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저의 외형적인 관상을 보고 "양 돼지"란 이름을 지어준 기억이 납니다.
키가 남들보다 훨씬 크고 얼굴이 젖을 먹고 찐 어린아이처럼 통통하게 보이는 동시에 자주 영어로 말하고 발은 길고 마당발이라 제 발에 맞는 신발이 없어 "양키 시장"이라 부르는 곳에 가서 미국인들이 사용한 옷이나 구두를 구입하여 신었기에 친구들로부터 주워진 별명이었습니다. 이런 별명 외에도 미국 생활을 하면서 경전에 있는 영어 인명을 애칭으로 일컫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붙여 준다든가 혹은 살던 곳이 좋아서 그 곳 이름으로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생을 넘어 살았던 도시 이름을 따서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3살에 고국을 떠나 "타국 살이"한지 벌써 49년이나 됩니다. 49년 중에 37년을 North Carolina 서북 쪽에 있는 Appalachian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가 도시인 Blowing Rock이란 시에서 살았습니다. 이토록 그 산속에서 오래 살았으니 마치 제 고향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추억의 대부분도 이 산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은퇴한 후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신다는 Greensboro로 이사 왔어도 그 산골짝 도시 이름이 너무나 제 마음에 들어 이 도시 영어 이름을 나름대로 한자로 직역해서 바람 "풍"과 바위 "암"을 사용하여 "풍암"도시라 불러 보곤 했습니다. 순수한 우리 나라 말로는 "바람 바위"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산맥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도시니까 이름 그대로 바람도 세차게 불기도 하고 바위도 많이 있습니다. Greensboro로 이사를 왔어도 일 년에 한 두번씩 "바람 바위"시가를 둘러보거나 아니면 그 곳 생각을 이따금 합니다.
그 도시를 우리 말로 자주 그렇게 부르다가 언젠가 저도 모르게 저절로 나 자신을 "바람 바위 태생"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바위"는 우리 나라 동요나 일반 가요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도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이 소재를 중심으로 영화 화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경전 속에서도 꽤 흔한 주제로 사용된 것을 독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람"과 "바위"란 소재로 시들을 쓴 작가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영어 권 작가들을 든다면 영국의 자연 계관 시인 워즈워스(William Wordswoth 1770 - 1858)나 작가 이름은 모르지만 16세기의 웨일스(Wales) 사람이 쓴 시들이 지금도 머리에 쉽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전 세계 문학 속에서 비일비재 한 주제로 등장하는 "바람"과 "바위"는 저에게 너무나 "시"적이며 살았던 도시 이름과 안성맞춤 같아 저의 아명을 "바람 바위" 혹은 "풍암"이라 짓게 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람은 뼈가 없습니다. 바람은 살이나 그 속에 생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붉은 피도 없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다리라든가 무엇을 들 수있는 팔 같은 것도 없습니다. 뼈, 근육, 심장, 핏줄, 팔다리 같은 것을 하나로 감싸주는 가죽 같은 것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사람의 몸이나 맘처럼 "줏대"같은 것을 찾아볼래 야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강합니다. 아니 "줏대"가 없기 때문에 강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의심 없이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꼭 집어 말하지 못해 "모르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 해봅니다. 그 "곳"에서 나오 기만 하면 푸르디 푸른 바다일지라도 반드시 하얗게 질리고 야 맙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텅 빈 들판에도 있습니다. 숲에도 있습니다. 산에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어 옵니다. 바람은 세월이 흘러가도 늙지 않습니다. 바람은 태어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은 맛도 냄새도 없습니다.
바람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은 어디든 없는 데가 없다 지만 보이지 않아서 자기의 존재를 인간에게 이따금 각성 시키려고 귀찮을 정도로 청각에 자극을 주는 시끄러운 소리로도 불어옵니다: 바람은 말이 없는, 말 아니 하는, 말을 못하여 소리만 냅니다. 바람은 예의나 버릇없어 대담하고 태연합니다.
바람은 바람직하지 않기도 하고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멀리 저쪽에 있기도 하고 가까운 이쪽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저 만큼에 있기도 합니다. 바람은 태양을 만나면 뜨겁디 뜨겁기도 하고, 구름이나 달을 만나면 서늘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바람과는 전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만 바람에 못지 않게 바위도 좋아합니다. 바위는 바람과는 달리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는 그저 그냥 그기에 가만히 앉아 무엇을 감탄하고 만 있는 것 같습니다. 회오리 바람이나 태풍이 불어 닥치면 아름드리 참나무는 갈기 갈기 찢어질 뿐만 아니라 그 뿌리 체 뽑히어 쓰러지고 그 나무 주변에 있는 집이나 모든 것이 이리저리 휘말려 날아가 버리는 대도 바로 그 나무 옆에 고스란히 앉아있는 "돌로 꽉 찬 바위"는 그 부피에 관계없이 눈이나 비를 동반한 바람에 얻어 맞아 이리 저리 깎이면서도 끄떡 없이 앉아 침묵으로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하면서 바람을 감탄하는 태연한 자태 같아서 더욱 성스럽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위가 성격 상 서로 모순되는 면이 있다지만 그래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선택 될 수도 없는 이율 배반 적인 창조물이기에 바람에 끄덕 도 않는 바위 같이 운치스런 침묵의 맛을 가지고 살고 싶기도 하고 또 한 줄기 바람처럼 왔다가 "멋"있게 사라지는 바람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반생을 보낸 그 산속 도시 이름 따라 스스로 "바람 바위"란 아명을 만들었던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명"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불러보십시오--- 참 즐겁습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다음 달 지면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바람 바위(풍암)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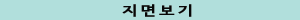

 | |